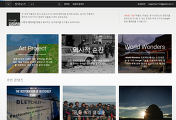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Banksy)는 길거리에 그래피티를 그려서 명성을 얻은 아티스트입니다. 다른 그래피티 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래피트들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가득하고 그 비판의 칼날이 아주 매섭고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작품을 길거리에 그립니다.
이 뱅크시가 2005년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미술이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5년 미술관 테러를 가합니다. 그는 권위가 철철 넘치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 가고 싶고 자신의 작품을 걸고 싶은 뉴욕근대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브루클린미술관, 미국자연사미술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에 몰래 들어가서 자신의 작품을 살짝 걸어 놓고 나오는 게릴라 전시를 합니다. 이를 위해 뱅크시는 모자를 쓰고 수염으로 변장하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방독면을 쓴 여인의 초상화를 몰래 걸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당신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군요>입니다. 이 그림은 다음 날까지 전시 되었습니다.
그는 브리티시 미술관에 들어가서 <원시인 마켓에 가다>라는 작품을 살짝 걸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웃기는 작품입니다. 마트에 가는 쇼핑족을 동굴 벽화로 페러디 한 작품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뱅크시 작품을 발견한 브리티쉬 미술관은 이 작품을 영구 소장하기로 합니다. 뱅크시의 농담을 눙치는 미술관의 태도가 대단히 유쾌하네요
뱅크시의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술 작품과 예술이 아닌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정말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미술관이나 유명 갤러리에 걸리는 것이 아닌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 갤러리에 걸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장소가 예술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뱅크시와 비슷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라이프헌터라는 아이디로 올려진 한 영상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덜란드 현대 미술관에서 감정가 실험을 한 영상으로 수백억 원짜리 미술품들이 있는 네덜란드 아르험 미술관에 이케아에 산 10달러 짜리 싸구려 그림을 전시하고 전시장에 들린 사람들에게 이 작품 가격을 감정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10달러 짜리 이케아 그림을 보고 디테일이 정교하며 모던 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작가의 혼이 담겨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네요. 이에 그림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묻자 110만 원부터 30억까지 아주 비싼 가격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라이프헌터는 이 미술품은 이케아에서 10달러 주고 산 제품이라고 말하자 황당해 하거나 말도 없이 돌아서서 가거나 웃어 버립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학습된 감동에 쉽게 길들여진 존재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을 제대로 느끼기 보다는 이미 그 예술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왜 위대한지 왜 유명한지, 왜 유의미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 지를 예술품을 보기 전에 텍스트로 읽었고 그 텍스트 내용을 내 감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봅니다.
그게 올곧은 작품 감상법이고 내 감상일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써 놓은 예술 감상에 내 감상을 동기화 하는 아주 수동적인 감상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빨간색은 정열적인 것이라고 배워 왔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장미꽃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기도 전에 그건 으레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예 못 박아 놓게 되었다. '정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때, 그 정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알 듯하면서도 꼭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정서가 있는 것이 더 인간답게 느껴지고 또 무언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서란 지식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꽃을 보고 느끼기도 전에 배운 대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비록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느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정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우의 클래식 FM 서문 중에서>
사진전에 들어서서 절대로 팜플렛이나 전시장 입구에 있는 서문을 먼저 읽지 마세요. 그냥 일단 사진을 보십시요. 그 작가에 대한 정보는 검색으로 찾지 마십시요. 그냥 보세요. 보면서 느껴보세요. 아무 것도 안 느껴진다고요? 네 그게 내 감상입니다.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가 내 감상입니다.
그 다음 전시장 설명서를 읽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십시요. 설명을 듣고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 감상입니다. 다만, 전시장 서문에 적혀 있는 글 중에서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아름답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랍다 식의 글을 쓴 평론가의 감상은 다 지우십시요. 그건 평론가의 감상이지 내 감상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술 작품 감상법을 잘 모릅니다. '로버트 카파'나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유명한 사진작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작품을 보기 때문에 이미 배운 지식으로 부터 나오는 감상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정보들이 감상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런 지식 자체는 미리 섭취 해도 되지만 타인의 감탄사는 무시하십시요. 그건 내 감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운지를 책에서 배우는 것과 직접 장미꽃을 장시간 보고 관찰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된 예술에 대한 감상은 타인의 취향을 섭취한 것이고 보편적 감상이지 내 감상은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품 앞에서 이게 왜 위대한 거예요?라고 묻는 당돌한 자세가 예술을 좀 더 진중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